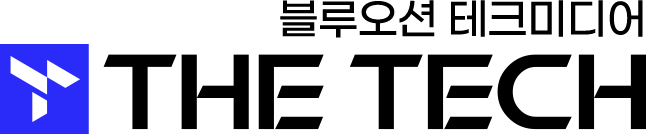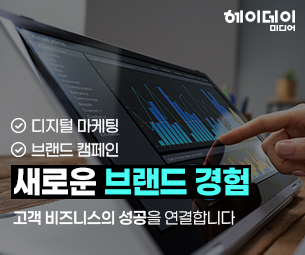|
스마트 테크‧산업 전문 미디어 <더테크>가 사이트 리뉴얼을 맞이해 다양한 테크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현재 주목되는 테크 영역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현재의 흐름을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독자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형택 디지털이니셔티브그룹 대표,[사진=더테크]](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30518/art_16831692661741_0e0601.jp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더테크=문용필 기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하 DX) 전문가인 김형택 디지털이니셔티브그룹 대표는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했다. 인공지능(AI)를 위시한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DX를 화두로 삼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목적’으로만 보고 빠른 결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결국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현재 DX 컨설턴트로, 또는 강연자로 활동하면서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게 ‘DX 길라잡이’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와 별도의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유익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서울 낙성대역 근처 카페에서 김 대표를 만나 DX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DX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는 점에서 꽤나 유익한 시간이었다.
‘DX 전도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신데요. 최근에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DX 관련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신 트렌드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DX의 원년은 2016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듬해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DX전략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DX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경영전략이기 때문에 5년 정도의 시간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0년이 마지막 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 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이전까지의 DX가 점진적인 혁신이었다면 2020년부터는 가속화와 전면화가 이뤄지고 있고 투자도 과감해졌어요.
트렌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초창기 DX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것을 도입하는 ‘테크 드리븐’(Tech-Driven) 형태였다면 이제는 업무 방식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과 사람의 역량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활용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전략인데요. 많은 기업들의 디지털 핵심전략이에요. 말 그대로 끝과 끝이 연결되고 통합된다는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심리스(seamless)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백엔드 데이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서비스 등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조직의 일관성 있는 DX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심리스’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DX 자체의 정의는 ‘전략’이라는 측면의 정의에요. 제가 앞서 언급한 부분들은 전략 수립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은 (DX)역량이 쌓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상품을 내놓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단계가 왔다고 볼 수 있죠. 기존의 프로세스나 업무 자체에 디지털을 결합시켜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초창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DX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DX라고 하면 ‘업무 자동화’ 혹은 ‘업무의 컴퓨팅’화를 생각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DX를 ‘중장기 경영 전략’이라고 이야기해요. 업무 자동화나 기술 그 자체라기 보다는 달라진 프로세스나 고객, 경쟁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디지털 역량을 쌓아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DX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털사이트에서 ‘transformation’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생물학적으로는 ‘형질 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미있는 대목인데요. 겉과 속을 다 바꿔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DX를 한다고 하면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로 겉만 치장하고 ‘우리 디지털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정한 DX라면 조직이나 업무 방식,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겉과 속 전체를 디지털로 탈바꿈해야 하거든요. (DX 도입) 초창기에 실패한 기업들을 보면 겉만 화려한 경우가 많았죠.
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DX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밸류 체인(Value Chain Transformation)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는 거에요. 기업의 업무방식을 보면 기획한 후 제조하고 생산하고 이를 다시 유통하고 마케팅한 후 판매하는 건데요. 이러한 업무 기반을 DX를 축으로 디지털로 변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의 신규 사업이나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Transformation)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히들 기업들이 생각하는 업무의 자동화와 편리화를 넘어 DX의 도입이 가져오는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우선 디지털과의 결합을 통해 (업무가) 더욱 빨라진다는 측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밸류 체인이나 프로세스를 많이 혁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흔히 업무 자동화를 ‘테크 드리븐’의 수단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업무속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건비도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을 통해 매출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죠.
두 번째는 통합된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DX의 사례로 아마존이나 토스같은 기업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해요.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를 한 기업이지 DX에 나선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진정한 DX 케이스를 이야기하려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을 가진 기업인데 디지털 역량을 쌓은 사례를 언급해야 하죠.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디지털로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했을 때 레거시 기업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오프라인 기반에서 수익 모델을 취하거나 마케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 통합된 환경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DX를 한다는 기업 중 상당수는 디지털이 수단이 아닌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중견기업, 대기업 위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요. 초창기엔 CEO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DX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선 DX라고 하면 ‘AI로 뭘 해보자’ ‘빅데이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을 통해 성과를 보이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DX는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하는데 성과는 나오지 않고 그러다보니 빠르게 결과를 내기 위해 교육 같은걸 시켜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2016년이나 2017년만 해도 전 사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나 파이선을 교육하는 회사들이 있었죠.(웃음)
<下편에 계속>
|
김형택 대표는... KT하이텔에서 전략기획과 신사업, 마케팅 전략을 담당했으며 베타리서치앤컨설팅과 마이다스 동아일보 전략기획실을 거쳐 현재 디지털이니셔티브 그룹 대표로 재직 중이다. 또한 금융연수원 겸임교수 및 DX아카데미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는 <그들은 어떻게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했나?>(2022),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2017)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