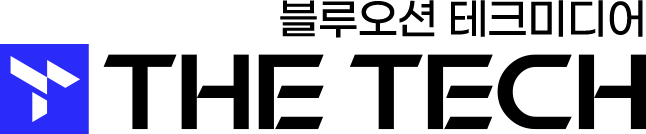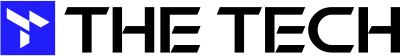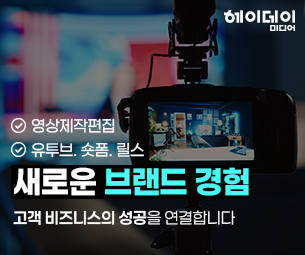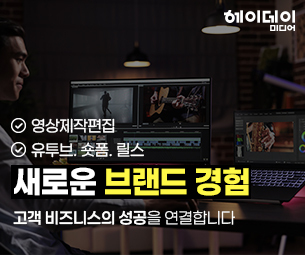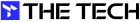![(왼쪽부터)이나래 KAIST 교수, 헤더 베리 조지타운 대학교수, 재스미나 쇼빈 조지타운 대학교수, 랜스 청 텍사스대학 교수. [사진=KAIST]](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583373517_54ac0f.png?iqs=0.9497548539192013)
[더테크 이승수 기자] KAIST와 국제 공동연구진이 기존의 ‘오염 피난처’ 가설을 뒤집고, 기업들이 이제는 ‘녹색 피난처’를 찾아간다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 전략을 제시했다.
KAIST는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 연구팀이 미국 조지타운대 헤더 베리 재스미나 쇼빈 교수, 텍사스대 랜스 청 교수와 함께 진행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전기차 등 녹색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오염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을 말한다.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다국적 기업이 환경 규제가 약한 국가에 생산거점을 두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오염 피난처’ 가설이 주류였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 제품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단순한 비용 중심의 글로벌 생산 전략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92개 수입국과 70개 수출국, 약 5,000개 제품의 데이터를 포함한 유엔(UN) 세계무역 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를 분석해 교역 패턴을 정밀 검증했다.
그 결과,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체 교역량은 감소하는 전형적인 오염 피난처 효과가 나타났지만, 녹색 제품에 한해서는 교역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일수록 녹색 제품의 수출과 조달이 활발해지는 ‘녹색 피난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제품 특성에 따른 국가EPI지수와 수출량 변화. [사진=KAIST]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6583391325_720c64.png?iqs=0.7992561061688102)
이는 단순히 저비용 생산지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의 생산·거래 과정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특히 소비자와 직접 맞닿는 최종 소비재 스마트폰, 의류, 음식, 화장품, 가전, 자동차 분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환경운동이나 NGO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의 수출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이나래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이 더 이상 비용 효율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기업의 환경적 정당성이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강력한 환경정책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색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영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터디스(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IBS) 9월 1일자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