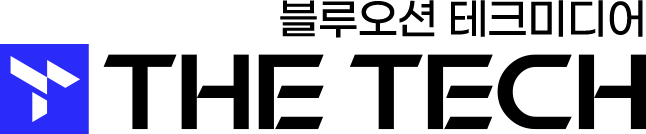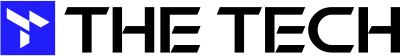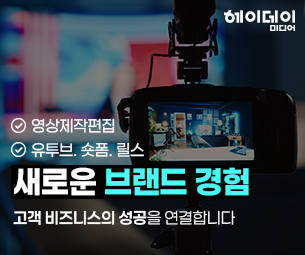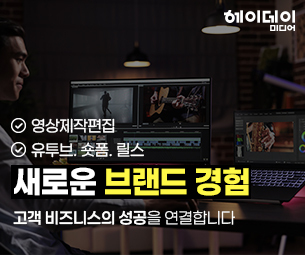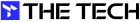![제조 AI 세계 시장 규모(억 달러) [그림=한국기계연구원]](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2027525618_a8cb59.jpg?iqs=0.14586880933804858)
[더테크 서명수 기자] 세계 제조업이 AI와 디지털 전환(DX)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제조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기계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라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아무리 고도화되더라도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주체는 기계·장비이며, 제조혁신의 성패는 두 기술의 결합에 좌우된다는 진단이다.
전 세계 제조 기업들은 이미 AI 중심의 혁신 경쟁에 진입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드마켓츠에 따르면 제조 AI 시장은 2025년 342억 달러에서 2030년 1,550억 달러로 성장하며 연평균 3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제조 강국들은 국가 전략과 산업 정책을 총동원해 AI 기반 제조혁신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전략은 하나의 공통점을 보인다. AI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 성능을 함께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라별 제조 AI 시장 규모(억 달러) [그림=한국기계연구원]](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2027521472_e5aa77.jpg?iqs=0.14022831873218178)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 엔비디아 팔란티어는 AI·클라우드·로봇 기술을 통합한 자율제조 시스템을 적용했다. 유럽의 지멘스, 에이비비, 보쉬는 ‘AI 팩토리’ 전략과 인간-로봇 협업 고도화에 나서고 있으며, 일본의 파낙, 오므론, 히타치는 로봇 기반 지능형 생산라인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 시아순, 폭스콘은 ‘AI+제조’ 정부 전략 아래 공장 자동화와 기술 내재화를 대규모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AI 팩토리’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전자, 한화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등이 AI·로봇·디지털트윈을 융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도 디지털트윈, 기계데이터플랫폼, 가상공학플랫폼 등 AI/DX 3축 체계를 마련해 제조 현장의 지능화를 지원 중이다.
그러나 한국기계연구원 보고서는 “AI만으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AI가 도출한 해답을 실제 성능으로 구현하는 주체는 결국 기계·장비이며, 제조 경쟁력은 기계의 물리적 성능과 AI 알고리즘의 지능이 곱해진 ‘곱셈적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1148/art_17642030639476_83ed4b.jpg?iqs=0.3251023449832783)
다시 말해 AI는 기계가 낼 수 있는 최적 성능을 탐색하고, 기계는 AI의 최적해를 더 넓은 범위에서 구현해낸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기계 성능이 떨어지면 성능이 제한되고, 기계가 아무리 우수해도 AI가 미흡하면 효율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구조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근본적인 리스크도 짚었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핵심장비와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위험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미래에는 AI 기술만으로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기계 기술의 자립과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경고다.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정책센터 이운규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AI 중심 경쟁이 치열하지만, 앞으로는 기계 기술이 제조업 경쟁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며 “AI 고도화와 함께 기계 기술 내재화를 준비하는 것이 국가 제조 경쟁력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