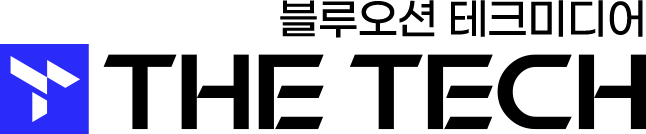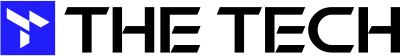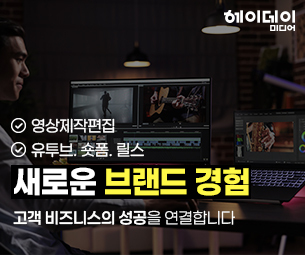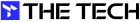![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3세대. [사진=테슬라] ](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60105/art_17697591933161_e1c49f.jpg?iqs=0.8229577059797671)
[더테크 서명수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을 넘어 물리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는 ‘피지털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술 경쟁과 함께 규제·표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공장과 도로, 가정으로 확산되면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와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산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피지털 인공지능을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의 판단 영역까지 일부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공백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기준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상용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kotra 뉴욕 무역관]](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60105/art_17697591935785_5ddead.jpg?iqs=0.4989554339273594)
이에 국제사회는 표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며,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을 통해 자율성과 위험도가 높은 로봇·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엄격한 사전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휴머노이드가 단순 기계가 아닌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역시 자율주행과 로봇 안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로봇의 판단 오류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 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향후 보험·법률 시장까지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규제를 ‘제약’이 아닌 ‘진입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테슬라와 아마존, 현대자동차 등은 실증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인간 인식·회피 기능과 군집 학습 구조를 통해 안전 설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BMW 공장에서 테스트 중인 피규어 AI 휴머노이드 02. [사진=BMW]](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60105/art_17697591929571_28cc84.jpg?iqs=0.2979457545712736)
전문가들은 향후 피지털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이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표준을 선점하는 능력’에서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를 위해 기술 완성도 못지않게 규제 대응 역량과 국제 표준 참여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과 국가는 이후 시장 규칙을 설계하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피지털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산업의 대안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다만 기술 혁신의 속도만큼이나 규제와 표준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확산 속도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피지털 인공지능 시대의 승자는 더 똑똑한 로봇이 아니라, 기술과 제도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