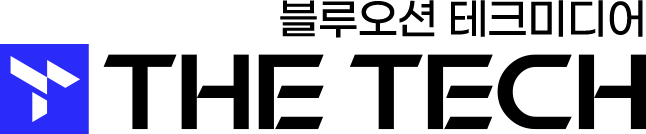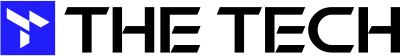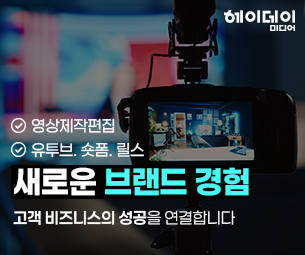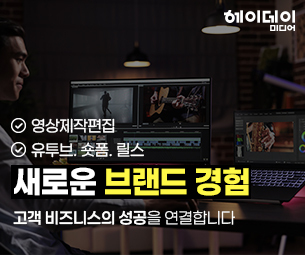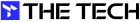![(좌측부터) 한영현 박사, 이춘경 박사(중앙 위),조광현교수(중앙 아래),김현진 박사과정. [사진=KAIST]](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573176134_2f2149.jpg?iqs=0.17086934846844715)
[더테크 이지영 기자] 세포의 상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은 신약 개발, 암 치료, 재생 의학 등 생명과학 전반의 핵심 과제다. 하지만 적합한 약물이나 유전자 표적을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KAIST 연구팀이 이를 해결할 새로운 인공지능(AI) 해법을 내놨다.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은 세포와 약물 반응을 ‘레고 블록’처럼 분해하고 재조립해 예측하는 생성형 AI 기반 세포 상태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이미지 생성 AI의 핵심 원리인 ‘잠재공간’ 개념을 세포 연구에 적용했다. 연구팀은 잠재공간에서 세포의 상태와 약물의 효과를 각각 분리해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를 조합해 실제로 실험하지 않은 세포-약물 조합의 반응을 예측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더 나아가 특정 유전자를 조절했을 때의 세포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실험에서도 성과를 냈다. AI가 대장암 세포를 정상 세포에 가까운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분자 표적을 찾아냈고, 연구팀은 이를 세포 실험으로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약물 효능 예측’을 넘어, 약물이 세포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범용 AI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조광현 교수는 “이미지 생성 AI에서 착안한 ‘방향 벡터’ 개념을 세포에 적용했다”며 “특정 약물이나 유전자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반응까지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세포를 목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는 설계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신약 개발과 암 치료는 물론,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는 재생의학 연구에도 응용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성과에는 KAIST 한영현 박사, 김현진 박사과정, 이춘경 박사가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시스템(Cell Systems)’ 10월 15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사업 및 기초연구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