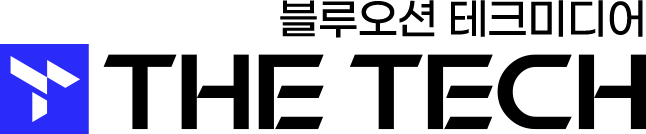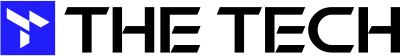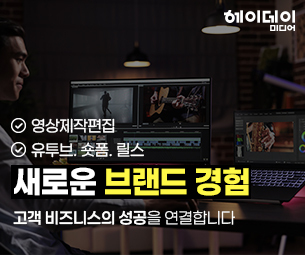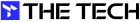|
스마트 테크‧산업 전문 미디어 <더테크>가 다양한 테크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현재 주목되는 테크 영역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현재의 흐름을 짚어보기 위함입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독자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문가 인터뷰 보기> [디지털헬스케어] 이병일 머스트 액셀러레이터 파트너 上 [디지털헬스케어] 이병일 머스트 액셀러레이터 파트너 下 |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사진=더테크]](http://www.the-tech.co.kr/data/photos/20230834/art_16929513723844_878570.jpg)
[더테크=조재호 기자] 테슬라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기차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 번호판’을 단 차량을 도로에서 목격하거나, 전기차 택시를 타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긴다. 전기차가 늘어나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도 이 둘을 결합한 모빌리티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인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황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계의 완결성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런 믿음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학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요. 최근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도시공학 중에서도 교통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엔 교통이라고 하면 ‘인프라 건설’을 많이 떠올렸는데 저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다뤘죠. 그러다 보니 그게 모빌리티가 된 것이고요. 요즘엔 교통이라고하면 도로나 철도처럼 인프라를 공급하는 역할인데 모빌리티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수단을 많이 다룹니다.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사용자이면서 운전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사람을 대신해 운전하는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고 드론일 수도 있어요. 무인 선박도 운항을 시작했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시작으로 자율운항 선박이나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큰 관심을 보이는 UAM(Urban Air Mobility) 등이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CASE가 있는데요. C는 Connected(연결성), A는 Autonomous(자율주행), S는 Shared(공유), E는 Electrification(전동화)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A, 즉 자율주행입니다.
최근에는 A와 C가 좀 연결이 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건 차량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가 스스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원거리에 일어나는 일은 인프라가 파악해서 차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CAV(Connected Automated Vehicle, 연결기반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C와 A를 분리했다면 최근엔 CAV라는 통합된 주제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량들은 대부분 전기차라서 E와 연관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 사람들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결국 공유의 S까지도 합쳐질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CASE가 분리되어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통합되어서 이동 그 자체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여러 레벨로 나뉘는데, 현재 시스템은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로의 발전을 위해 우선 해결할 과제가 있을까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의 발전 속도는 빠릅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 주도의 레벨3는 몇몇 자동차 기업에서 상용화했죠. 다만 고속도로 등 일부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주행이 허가됐고 속도 제한도 100km 이하로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2.5레벨이 현실적인 지향성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조차도 미국에서 송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 소지를 둔 공방이죠. 이러한 측면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3단계는 아직까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선 GM의 크루즈(Cruise)나 구글의 웨이모(Waymo)가 로보택시 영업을 허가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어떠한 신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기계의 어떤 완결성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논쟁도 많지만 AI가 개발됐다고 사람들이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의 진보와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갭(gap)이 좀 있습니다.
자율주행 3단계 이상부터는 시스템 주도의 운행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운행이 방어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차를 노려 ‘끼어들기’를 하는 등 악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계는 주어진 원칙에 ‘따라’ 운행하는 겁니다. 사람은 주어진 원칙을 ‘활용’하죠. 어떤 면에선 훨씬 더 영리하게 운전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세가 되면 완벽하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도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해요. 원칙을 지키는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불안한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허락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믿음’이 어떻게 ‘기계의 믿음’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는 문제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샌프란시스코의 케이스처럼 ‘이렇게 해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이런 점만 조심하면 되더라’ 같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기계나 AI에 대한 수용성이고 이것이 뒷받침돼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차가 규칙을 준수하게되면, 규칙을 준수하는 대신 활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교통 규제가 나올 거예요. 과거엔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끼어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CCTV가 늘어나고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줄었죠.
정리하자면 기술의 진보와 함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법률이나 제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했더니 규칙도 잘 지키고 사고도 없다면 자동차를 모는 방식이 자율주행 위주로 바뀌겠죠. 현재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같은 규칙이 있는데, 이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면 이에 맞춘 법률이 정해지겠죠.
이 부분은 굳이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우리네 운전 방식을 되돌아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바뀌어온 형태니까요. 이런 형태라는 것은 (결국) 경험의 결과겠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식의 개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식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전환되거든요.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중 하나겠죠.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인식의 전환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선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사고가 안 나서 좋다면 그 환경에서만 자율운행차가 운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엔 사고가 조금 날 수도 있는 환경에서도 일부분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사고가 없으면 (자율주행을) 전면 허용해야겠지만 조건이 있겠죠. 시범 운행 지구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차가 운행하는데 방해물이 없이 다 통제된 상황에서 시범 운행을 하는거죠.
AI 개발을 보면 우리나라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하고 미국은 포지티브(Positive)하게 규제해서 온도 차가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도 비슷한 상황일까요.
현재 시범 운행 지역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앙정부 지향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고 진행하는 데에서 사고가 나면 허락한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정도 시범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노하우가 쌓이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서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형태의 시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경험해야 이를 인식하는데 현재의 시범 운행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너무 안전한 도로 영역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러면 자율주행이 좋은지 나쁜지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율주행에서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는 건 아무래도 차량 중심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자율주행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CASE의 C, 커넥티드 이야기를 해보죠. 차량에 탑재된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통해 멀리 있는 정보를 받습니다. 이런 인프라에는 로드 사이드 유닛(Road Side Unit)인 노변 기지국이 있는데요. 보행자의 휴대폰도 하나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V2X(Vehicle to Everything)라는 자율차 운행방식이 있는데 아직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주체들이 주로 공공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나 지자체 인프라에 센서를 달아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해주죠. 고속도로에서 교통량이나 사고 지점을 알려주는 전광판인 FTMS(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교통관리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차마다 다른 AI가 운전하는데 필요한 개별적인 정보가 아닌 모든 차량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별 차량 자체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니까 자율주행에 도움을 주기 힘들죠. 차별화된 정보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건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프라 정보의 경우엔 앞으로 민간 사업자가 차량에 특화된 정보를 보내야 하고 제조사가 이를 함께 제공하면 더욱 효율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상용 차량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용 차량 분야에서도 다양한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 중인 대부분의 자율주행셔틀도 대중교통의 영역입니다. 지금 서울을 보면 버스 전용 차선이 많아요. 고속도로에도 있고요. 이렇게 차선이 정해진 부분에 먼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차량이 다니는 노선보다 자율주행을 도입하기 비교적 쉬우니까요. 스웨덴의 경우에도 버스에 자율주행을 적용하고 원격으로 조정해요.
물류 분야도 빠르게 시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수단이 생겨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양상이고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전에 자율주행 차량이 전체의 5%를 차지하기 힘들어요. 운전이라는 행위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너무 멀리 보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율주행이 완전히 정착되어도) 운전자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택시를 이용할 일이 있다면 운전자가 있는 게 좋거든요. 정서적인 측면이나 본인에게 맞춰주는 운전자 서비스를 받고 싶으니까요. 모든 차량이 100%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고급 모빌리티 서비스는 사람이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下편에 계속>
|
황기연 교수는.... 서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을 거쳐 홍익대 관리부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자문위원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및 자율주행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저서는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2020), <도시의 이해>(2016) 등이 있다. |